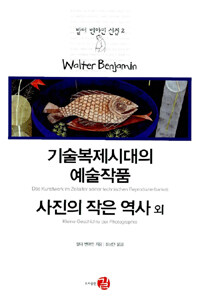★ image or real
수전 손택, 미디어속 타인의 고통에 대해 아는가? 본문
기술복제시대 예술의 현대적 가치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창출된 예술이 크게 두가지 존재한다. 그건 바로 사진과 영화. 이는 카메라라는 물건을 가지고 무언가를 찍어내는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예술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의 특징은 무한대의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하나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일 처음 인화한 사진과 두번째 인화한 사진 사이에 어떤 차별점을 부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은 아우라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 아우라라는 것을 잘 뜯어보면 어떤 숭배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명화를 직접 보았을때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단 하나의 원본. 단 하나의 원본이 만들어졌던 그 상황. 그리고 그 단하나의 원본을 멀리서 바라보며 느끼는 단하나의 경험. 이렇게 되면 대상을 향한 어떤 엄청난 몰입과 숭배 및 경외를 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우라를 지니는 예술은 기술복제의 시대에 들어와 급격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예술이 대중과의 거리를 급격히 좁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거다. 사진 한장 찍어놓으면 여러분은 그걸 인화해서 사진첩에 넣을 수도 있고 내 싸이에 올릴 수도 있고 내 핸드폰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다. 아주 다양한 사용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예술작품과 대중의 거리를 매우 좁히게 되고 아우라를 상실한 예술작품은 숭배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전시의 대상으로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아우라의 상실을 불러온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은 재미있는 현상을 불러오는데 이를 두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전환'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이런거다. 사진을 보자. 사진은 그것 자체가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숭배의 대상이 되긴 힘들지언정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난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담은 사진 같은거 말이다. 영화는 어떠한가? 이 역시 아우아를 상실한 전형적인 현대 예술이지만 어떤 비판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디 사진과 영화뿐이겠는가? 다양한 패러디 문화도 여기에 속하고 그외 찌라시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예술의 정치화이다.
예술속 타인의 고통
아우라를 잃어버린 대중문화의 비판문화적 성격의 부여라.. 아주 맞는 말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걸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독재국가의 국민들의 비참한 삶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와서 보여준다던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전쟁터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준다던지.. 그걸 찍으로 가는 기자는 무슨마음으로 갈까? 자기딴에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려주고 자신이 보고 느낀 이 참혹한 현실을 이 참혹한 고통을 저너머 티비 앞에 있는 대중에게 알려주어 그 고통을 나누려고 했을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무엇이 느껴지시나? 저들의 고통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지시는가? 일단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헉 어떻게 저렇게 까지 하는거지??' 그리고 동정심도 느껴지실테고 'ㅉㅉㅉ 불쌍한 사람들' , '뭔가 도와는 주고 싶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등등 저걸 찍은 기자는 저 고통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길 바랬겠지만 여러분들은 미디어속에서의 저 영상과 저 사진을 그냥 소비했을뿐이다. 소비했다라.. 무슨 의미일까.. 길에서 과자를 한개 사서 먹듯이.. 극장가서 영화를 한편 보듯이.. 그렇게 소비했다는 말이다. 여러분은 9시 뉴스를 영화보듯 그렇게 감상하고 그뒤에 선덕여왕을 보고 열광하지 않았던가..
즉 현대적 예술이 예술의 정치화ㆍ사회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저것을 보고 그냥 '아 난 아니구나'라고 안심하고 만족하는 관음증적 향락만을 불러왔을 뿐이고 결국 저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와 동시에 저 거대한 일에 내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무력감이 더해지게 되면서 대중은 타인의 고통을 타자화 시킨다. 미디어속에 전시된 고통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 수록 더 좋다. 피튀기면 더 좋고 고함소리 등이 들어가 현장감이 살아있으면 더 좋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의 무감각화는 더욱 심화된다. 고통의 타자화. 여러분들은 티비를 통해 전시된 고통을 그냥 그렇게 감상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더 재미있는건 이를 놓고 우리는 나름의 해석을 가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한답시고 모여앉아서 해석을 한다. '왜 저런 현상이 생겼는가?' 이런 저런 이론도 갖다 붙여 보고.. 그렇게 또 미디어는 이걸 대중에게 전시하고 대중은 이를 소비한다. 해석이 끝나면 해석자들끼리 악수하고 돌아선다.
어디서 감히 우리를 논하는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툭하면 우리 우리 우리 나만 해도 계속 우리 타령이다. 어디 그뿐인가? 나도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아 음악틀어 놓고 타인의 고통을 철저히 타자화시킨채 해석을 가하고 있다. 참 웃기고도 서글픈 일이렸다. 그러고도 우리인가? 그러고도 민족인가? 그러고도 같은 국민인가? 난 모르겠다.